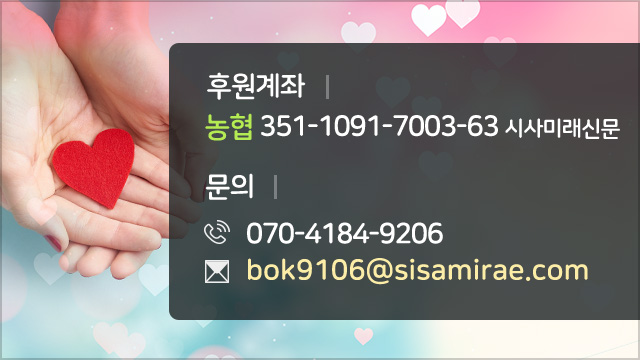(시사미래신문)
“싸울 적이 없는 군대, 목적이 없는 군대가 되고 있다”는 표현은 단지 과장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 논쟁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군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국가의 생명선을 지키는 최후 보루다.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조직되는 존재다.
군의 존재 이유가 흔들릴 때, 곧 국가의 기둥이 흔들리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에도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도발은 북한이 군사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현실적인 위협 환경이 지속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한편, 최근 한국 정부에서 남북 군사합의인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이 정지된 것은 한국군이 제한돼 온 대응 능력을 정상화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 합의는 과거에는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장치였으나, 북한의 잇단 약속 불이행과 일방적 파기로 현재 사실상 유효성이 크게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군의 연합훈련 축소나 북한과의 긴장 완화 조치가 논쟁적으로 제기된다. 그러나 한·미 연합훈련은 한국군과 미군이 복합적 위협에 대비하는 핵심 수단이며, 연합 억지력과 전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지난 해 실시된 Ulchi Freedom Shield 훈련은 이러한 역할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문제는 단순히 훈련의 유무가 아니다. 군 인사와 조직 운영이 정치 논리에 휘둘릴 때 가장 큰 위험이 발생한다. 군 인사는 오로지 전문성과 전투지휘 능력, 병과 이해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하면, ‘능력’보다 ‘정치적 충성’이 우선되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독재 시대에나 볼 수 있는 비극이며, 민주국가에서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군의 색깔이 바뀌고, 군사 전략과 인사의 기준이 정치적 이익에 따라 변한다면, 군은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하수인이 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며, 국방력 자체가 정치적 협상 카드로 전락한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이다. 국민과 군 사이의 신뢰, 군과 정치 사이의 건강한 분리, 그리고 일관된 전략적 대비태세가 유지될 때만 국가의 생존은 보장된다. 정치가 군을 손에 넣는 순간, 국가도 국민도 모두 붕괴할 수 있다. 이 점은 현 정권과 여당이 깊이 되새겨야 할 근본적 사실이다.